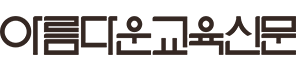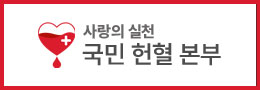아주 오래 전, 남한산성 너머에 있는 교도소에서 강의를 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들에게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약간의 호기심도 생겼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마칠 수 있었다.
봉천동의 장애인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삶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강의를 해 달라는 거였다. “그 분들에게 내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원한다고 하니 잘 해야겠지.” 생각하면서 수락을 하고 또 걱정을 한다. 강의를 하고 돌아 오니, “좋은 강의 감사하며, 이메일을 쓰느라 몇 시간이 걸렸다”는 인사의 글이었다.
작년 가을, 세종시에 신설학교인 종촌중학교 1학년 250명의 학생들에게 2시간의 강의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을 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어린이들에게 무슨 강의를? 그것도 체육관에서 250명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교장선생님과 차 한 잔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 선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질서정연하게 의자에 앉아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진지하게 강의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일어서거나 떠드는 학생이 없었다. 뒤쪽에는 선생님들과 양쪽에 학부모님 등이 몇 분 앉아 있었으나, 학생들은 1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두 시간의 강의를 끝내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배우고 느낀 점이 더 많다는 의견을 전했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특별한 용건은 없지만, 그냥 전화 걸고 싶었다고 했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나 자신이었다. 정말 잘 가르치고 온 걸까? 그들은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말을 알아 들었을까? 내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내 강의는 정말 나 자신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나?
예전에 읽은 책을 다시 꺼내서 밑줄을 치며 읽는다. 다시 읽고 싶은 책 두어 권을 책상에 올려 놓고 번갈아 돌아가며 읽는다. 역사를 읽다가 철학을 읽다가 교육에 관한 책을 읽는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느 것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처음엔 대충 읽었겠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읽는다.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의 앞뒤를 비교해 가면서 읽는다.
전에 읽은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읽는다. “이렇게 좋은 책을 10년 전, 아니 30년 전에 읽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한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 메모를 하고 노트에 옮겨 적는다. 여태까지 이런 거 읽지 않고 무얼 하며 살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깊이 있고 상세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내 원고를 비교해 보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냥 다 찢어 버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는다. 아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나 몽테뉴, 정약용 선생이나 모두들 배움과 깨달음의 즐거움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인정했던 것 같다.
가르침과 배움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무엇이 더 즐거울까? 이 두 가지는 비교하는 게 아니다.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 이후, 인생 후반기의 삶(2nd Life)에 이르러,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가끔 두렵기도 하지만.